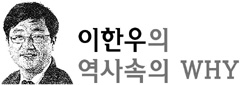| ||
|
조선의 경우 적자(嫡子)로 이어지던 왕통이 처음 방계로 이어진 것(傍系承統)은 선조 때다. 선조는 중종과 후궁 안씨의 손자였다. 그러면 고려에서 처음으로 방계승통한 임금은 누구일까? 고려의 왕통은 태조 왕건이 943년 세상을 떠나고 혜종(惠宗·왕건과 장화왕후 오씨 사이에서 난 장남), 정종(定宗·왕건과 신명 왕태후 류씨 사이에서 난 둘째아들), 광종(光宗·정종의 동복 아우) 등 이복(異腹)과 동복(同腹) 형제로 이어지다가 광종과 대목왕후 황보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경종(景宗)으로 이어진다. 광종과 대목왕후 황보는 이복남매 간이었다. 아마도 이 혼인이 없었다면 요즘 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천추태후'의 권력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종은 재위6년 만인 981년 2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태조 왕건 사후 38년이 흐르는 동안 혜종 정종 광종 경종 등 4명의 국왕이 바뀌었다. "소인들을 가까이 하고 착한 사람을 멀리했다. 이로부터 정치와 교화가 쇠퇴하였다"는 사평(史評)을 듣는 경종은 죽음을 앞두고 사촌 동생 개령군 치(治)를 불러 선위(禪位) 의사를 밝힌다. 자기 아들(훗날의 목종)은 아직 두 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종이 유일하게 평가를 받는 것은 이때 선위한 개령군이 왕위에 올라 비교적 안정된 정치를 베푼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령군 치는 경종의 외삼촌, 즉 훗날 대종(戴宗―추존왕)으로 불리게 되는 왕욱(王旭)의 아들이다. 왕욱과 (광종비) 대목왕후 황보씨는 둘 다 왕건과 신정왕태후 황보씨(원래는 왕후가 아니라 부인이었다가 개령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태후로 추존되었다) 소생이었다. 결국 왕건의 씨를 둘러싼 30명 가까운 여인들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는 왕후가 아니라 부인에 불과했던 황보씨였다. 태조의 일곱 번째 아들이었던 왕욱은 이복누이인 선의태후(이것도 추봉) 류씨와 결혼해 아들 하나, 딸 둘을 두는데 그 아들이 성종(成宗)으로 즉위하게 되는 개령군이고 딸 둘은 각각 경종을 모셨던 헌애왕후와 헌정왕후이다. 경종이 미련 없이 개령군에게 왕위를 넘긴 것은 바로 이처럼 겹처남이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 되면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현대적 시각으로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만큼 민망한 대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981년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통치하고서 3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성종은 사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고려사'를 편찬한 유학자들로부터 종묘사직을 설치하고 효자 효부를 기리는 등 유학적 세계관을 펼친 국왕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 성종도 역시 '고려' 사람이었다. 그의 왕후 류씨는 광종의 딸로 다른 종친에게 시집을 갔다가 뒤에 성종의 배필이 되었다 하니…. 경종의 죽음으로 일찍 과부가 된 성종의 큰 누이이자 경종비였던 헌애왕후가 드디어 애정행각을 벌이기 시작한다. 이미 경종과의 사이에 아들을 두었던 헌애왕후는 남편이 죽자 궁궐 내 천추궁(千秋宮)에 거처하면서 외척인 김치양(金致陽)을 끌어들여 온갖 추문을 만들어낸다. 보다 못한 성종은 김치양을 외방(外方)으로 내쳤다. 997년 성종이 재위16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경종과 헌애왕후 사이에서 난 목종(穆宗)이 등극한다. 18세면 충분히 친정(親政)을 펼칠 수 있음에도 왕태후가 된 헌애는 천추궁에 자리잡고서 섭정을 한다. '천추태후'란 말은 그래서 생겨났다. '돌아온 탕아' 김치양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고 심지어 목종 6년(1003년)에는 천추태후와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다. 천추태후와 같은 경종비였던 성종의 작은 누이 헌정왕후도 일찍 과부가 되자 왕건의 아들(이복 작은 아버지) 왕욱(王郁)과 통간하여 아들을 낳았다. 성종은 왕욱도 김치양과 마찬가지로 먼 지방(경상도 사천)으로 유배를 보낸 바 있다. 성종 사후 세상을 거머쥔 천추태후는 주변을 둘러보니 김치양과의 사이에 난 아들이 목종의 뒤를 잇는 데 방해물이 될 유일한 인물은 바로 헌정왕후와 왕욱 사이에서 난 대량원군(大良院君) 왕순(王詢)뿐이었다. 목종 재위기간 동안 왕순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결국 왕순은 목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된다. 22년간 재위하게 되는 현종(顯宗)이다. 그 바람에 왕욱은 안종(安宗)으로, 헌정왕후도 효숙 왕태후로 추존됐다. 다소 복잡하지만 고려 초 왕실 상황은 그랬다 다시 읽는 여인열전(16)황제국가를 지향한 여걸―천추태후 발행일 : 2002.07.24 / 느낌 / 38 면 천추태후 황보(皇甫·964~1029)씨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혹시 그녀를 아는 사람들도 김치양(金致陽)이란 신하와 간통한 왕비 정도로 기억하고 있기 십상이다. 그러나 고려 다섯번째 왕인 경종(재위 975~981)과 결혼, 헌애황후가 된 그녀는 그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고려 초기에 남긴 족적이 너무 큰 여인이다. /이덕일·역사평론가 고려 왕실의 족내혼 ◈고려 왕실은 현재 우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족내혼이 심했다. 족내혼이라기보다는 근친혼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이다. 정종의 제1비와 제2비는 모두 견훤의 사위인 박영규(朴英規)의 딸이었다. 고려 2대 임금 혜종은 자신의 딸을 이복동생 정종에게 주었으니 정종은 조카딸과 결혼한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왕건의 셋째 아들이었던 광종의 비는 태조의 딸인 황보씨였으니 이복 남매끼리 결혼한 것이었다. | |||||||||||||
'방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돌아온 일지매 (0) | 2009.01.30 |
|---|---|
| `천추태후`서 경종 역 열연 (0) | 2009.01.26 |
| <바람의 화원>은 정말 실패한 드라마인가 (0) | 2008.12.07 |
| 혜원(蕙園)의 그림 읽기 (0) | 2008.11.29 |
| 드라마 ‘타짜’에서 인기몰이 장원영 (0) | 2008.11.24 |